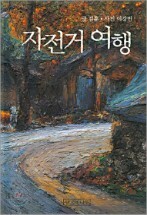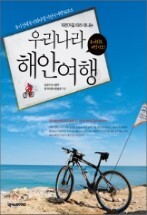고정 헤더 영역
상세 컨텐츠
본문
자전거점 운영자 찮은씨가 일찌감치 투표를 끝낸 날이었다. 무릇 자영업 하는 자라면 이런 임시공휴일에는 마땅히
가게 문을 열어야 하는 것이 당연지사일 터.
무슨 바람이 났는지 자전거의 방향을 돌려 삼랑진으로 내빼버리는 찮은씨였다.
구포대교를 지나 김해의 지방도를 질풍같이 달려 찮은씨가 맞이한 풍경이 사진과 같다.
파스텔톤의 철교는 삼랑진을 지나 진영을 거쳐 창원 마산 진주까지 이어지는 철길이다.
찮은씨가 사오년전 자전거로 지나면서 자기 멋대로 길의 이름을 지었더랬다. 길의 이름은 [가야 가는 길].
그의 뇌구조에서 짜낼 수 있는 수사의 한계였다.
낙석이 진행중이었고 느닷없는 뱀이 따뜻한 아스팔트에 해바라기를 하고 있으면 어쩌나 걱정하고
넘어가던 차에 찮은씨를 놀래킨 것은 낙석도 뱀도 아닌 생활싸이클을 타며 불쑥 나타난 초로의 자전거
여행자였다.
피차 허접한 복장의 자전거 여행자 두사람은 강한 연대감의 증표로 서로의 가방에서 양갱과 초코파이를
나누어 먹었다.
평소의 찮은씨 답지 않은 행동이어서 그의 지인들은 이 일에 관해 아직도 신뢰를 하고 있지 않다.
그는 사적소유에 대해 집착이 강하다.
일제 강점기 때 지어진 다리를 건넌다. 세월이 많이 지났음에도 건재한 것을 보면 어쨌거나 저쨌거나 저들의
토목기술 만큼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폭우가 쏟아진 다음날 물에 잠겨 끊어진 길을 건넌 적도 있는데, 길은 찮은씨를 기억할까. 그때는 자전거만 있으면
거침없는 찮은씨였는데, 요즘에는 그런 열정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그냥 무기력해보이기만 하는 거였다.
내리막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찮은씨를 반기는 보리밭이다.
찮은씨는 자전거에 몸을 반쯤 걸쳐놓고 오래 보리를 보았다.
타작을 끝낸 보리밭에는 따닥따닥 폭음탄 터트리는 것 같은 소리와 구수한 연기 냄새가 가득했다.
찮은씨는 일부러 숨을 깊게 들이마셔 그 기분나쁘지 않은 연기를 폐 깊숙히까지 들이마신다.
모판의 모는 이미 준비가 다 되었고, 태운자리를 갈아엎고 물을 댄 후 모내기가 이뤄질 터였다.
여름이 성큼 다가와 있었고, 찮은씨는 고개를 돌려 먼데 하늘을 보았다.
무엇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그는 자전거의 페달을 더 세게 밟아 앞으로 나아가는 거였다.
해봐야 등 뒤엔 바람밖에 없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