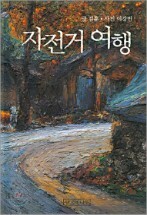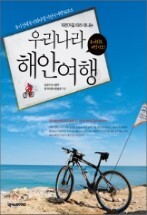그리운 바다 간절곶
생일날 미역국을 챙겨먹지 못한 사람이면 간절곶을 찾을 일입니다. 해풍의 소금 비린내가 아니라 조미료를 듬뿍 뿌린
매운탕 냄새와 대나무 발에서 복된 햇볕에 말라가고 있는 미역냄새가 그 바다로 가는 길에 가득하였습니다.
길게 튀어나온 모양이라 하여 간절곶(竿切串)이라고 이름 붙였다지만, 커다란 우체통을 보니 괜히 간절한 소망 하나를
엽서에 끄적여 부치고 싶었습니다.
아직 엽서라는 매체가 유효한지 모르겠으나 괜히 이런 바닷가에서 바람을 내내 받다가 손으로 꾹꾹 눌러 써 누구에게
사연을 전하고 싶어집니다. 봉인되지 않으니 바깥으로 드러나 내용을 아무나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블로그에 글씨기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네요.
길을 잘못 들어 찾아간 죽성의 포구입니다. 해운대에서 달맞이 고개를 지나 그냥 내처 앞으로만 달리면 되는데
천하의 길치는 어쩔 수 없나봅니다. 뭐, 이 정도는 일상다반사라 놀랍지도 않습니다.
덕분에 좋은 구경을 하고 쉬었다 가는 거죠.
텔레비전 드라마의 촬영장소였다는데, 안내판을 봐도 어떤 드라마인지 모르겠더군요. 인기가 없었나?
어쨌든 해운대 구민들의 나들이 장소로 퍽 괜찮아보였습니다.
멀리 고리 원전이 보입니다. 원자력발전소만 보면 이런저런 잡생각이 많이 납니다.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포기한 몇몇 유럽
국가의 선택은 향후 옳은 평가를 받을 것인지도 궁금하고.
당장 저렴한 요금으로 사용하는 지금 세대야 어쩔지 모르지만, 쌓여가는 방사능 폐기물과 원전의 안전문제가 늘 꺼름칙합니다.
차세대 혹은 그린에너지 개발에 대한 독일의 집착에 가까운 노력과 연구성과를 다큐프로그램으로 확인하다보면
이 사람들 정말 무섭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절곶 바다에 도착했습니다.
수평도 못맞추는 사진을 찍은 걸로 봐서 질풍자전거점 운영자가 조금 지치기는 지쳤나봅니다.
간절곶 입구에서 이생진님의 시 [그리운 바다 성산포]의 한 부분이 언뜻 생각났습니다.
「살아서 가난했던 사람, 죽어서 실컷 먹으라고 보리밭에 묻었다
살아서 술을 좋아했던 사람,
죽어서 바다에 취하라고 섬 꼭대기에 묻었다
살아서 그리웠던 사람, 죽어서 찾아가라고 짚신 한 짝 놓아 주었다
365일 두고두고 보아도 성산포 하나 다 보지 못하는 눈
60평생 두고두고 사랑해도 다 사랑하지 못하고 또 기다리는 사람」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는 무덤이 많습니다. 이씨 성에 덕자 암자라 새겨진 아주 작은 비석 앞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잘 안외워지는 시의 몇몇 구절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시인은 국가의 자산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작심은 없어도 간절곶에 오면 괜히 간절한 소망 하나가 생기기 마련인가 봅니다.
소망우체국 우체통에는 들락날락하는 사람들로 한가할 틈이 없습니다.
소망의 또다른 표현인 돌탑도 그 높이가 높아만 가고.
혼자여도 바다가 있으니 다들 섭섭하지 않은 눈치입니다.
부산에서는 자전거로 오전에만 출발하면 그곳이 어디든 오후 여섯시 이전에는 갔다 올 수 있는 곳입니다.
동해바다가 주는 또다른 그리움에 취해 보시길.
그럼.